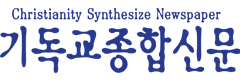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자백에 가깝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권력형 비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사건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덮여버리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또다시 “이 나라에 법이 살아 있는가”라는 절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장동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민간의 배를 불린,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낳은 거대한 구조적 범죄다.
국민의 땅에서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이익이 사라졌는데, 그 책임자들은 버젓이 정치 전면에 서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란, 바로 그 부정의 구조를 인정하고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정의의 칼은 녹슬었고, 검찰의 저울은 이미 기울었다.
검찰은 항소 포기의 이유로 “1심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그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양심의 문제다. 국민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칼끝을 거둬들였다고 느낀다.
과거 ‘적폐청산’을 외칠 때는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더니, 정권의 성격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꿨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화’이며, 사법 정의의 몰락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검찰 한 기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소 포기 뒤에는 권력층의 교묘한 계산과 정치적 거래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치적 부담’이라 말했지만, 진실을 덮는 행위야말로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의 안위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검찰이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다면, 사법 제도 전체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번 결정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행위다.
서민의 작은 범죄에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자들의 거대한 비리에는 관대하고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법의 이름은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다.
이 나라의 법이 강자에게는 무릎 꿇고 약자에게만 군림한다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할 뿐이다.
이제 검찰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지시가 작용했는가?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의를 저버린 권력은 잠시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기억은 결코 잊지 않는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패배 선언이다.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정치의 하녀로 전락시켰다. 이제라도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로 정의의 끈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법이 권력을 감싸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